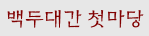백두대간사람들 24 도래기재- 금정에 금 마르니 초록은 깊어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강 댓글 0건 조회 223,401회 작성일 18-08-28 11:48본문
태백산에는 금송아지 두 마리가 산다고 했다. 한 마리는 북쪽 끝 금대봉 어딘가에 묻혀 있고 한 마리는 남쪽 끝 구룡산 자락에 묻혀 있다는 것이다. 금대봉에도 몇 번이나 금송아지를 찾으려는 이들이 다녀갔지만 결국 그들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남쪽의 금송아지는 하늘의 뜻이었는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태백산의 마지막 자락 구룡에 기댄 우구치리의 비극은 그렇게 시작됐다.
태백산과 소백산을 가르고 강원도와 경상도를 잇는 고개가 도래기재다. 춘양에서 고개를 넘으면 만나는 첫 동네에는 ‘우구치리’라는 돌 이정표가 세워져 있다. 도래기재에서 바라보는 골짜기 생김새가 마치 소의 입을 닮은 데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도 ‘금정’이라는 이름을 더 친숙하게 부른다. 일본인들이 금광을 개발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당시 금광에서는 물이 많아 나와 금을 캐는 것이 마치 우물 속에서 금을 기르는 것과 같다고 해서 금정(金井)이라 불렀다 한다. 이제는 같은 면인 춘양면에서도 금광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이가 많을 정도로 잊혀져 가고 있지만 금정은 한창 때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가는 금 산지였다고 한다.
“원산인가 함흥인가의 금광이 1등이었고 금정이 2등이었더래요. 한 달에 200kg이 넘으면 보너스도 주고 그랬지.” 이종식(71) 할아버지는 금정의 내력을 간직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노인 가운데 한명이다. 이 할아버지는 지금도 봉화일대에서 술안주로 오르는 금 이야기를 일축한다. “금은 무슨…. 이미 해방무렵부터 금이 줄기 시작했는데 뭘. 한국전쟁이 끝나고 대명광업소가 금을 또 캐고, 나중에 들어온 함태광업소는 몇 군데 시추까지 했지만 금맥을 못 찾았어. 이제 금 없어.” 88올림픽 무렵 함태광업소도 끝내 문을 닫았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온갖 소문이 무성하다. “일본인이 캐간 것은 금송아지의 다리 부분일 뿐이고 아직도 몸통은 남았다.” “광을 아래서부터 뚫어야 물이 안 차는데 꼭대기부터 뚫어서 물이 차올라 채광을 못한다.” “금맥은 있는데 광부들이 도둑질을 해가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 이 할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죄다 영문도 모르는 헛소리라고 일축한다.
금정에 금광의 역사를 시작한 것은 강원도 정선사람 김태연씨라고 이 할아버지는 회고한다. “그 사람이 저 상동읍 덕구에서 처음 광산을 열었어요. 길도 없는 첩첩산중에 어떻게 찾아왔는지 몰라. 와서는 마루 너머 천평 무랭이골에도 구뎅이를 파고 여기도 팠지. 그러다가 일본인들에게 광업권을 넘겼어요. 그때 엄청난 돈을 받아서 50대 재벌에 들었대지.” 이 할아버지 기억이 세월을 역류한다.
금정에 본격적으로 금광을 개발한 것은 일본인들이었다. 산 너머 무랭이골에서 캐낸 광석을 제련장이 있는 금정까지 나르기 위해 그들은 산 허리에 터널을 뚫었다. 엄청난 금의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당시로서는 드문 자동화 설비가 갖추어졌다. 자동화 설비를 돌리기 위한 전기도 일찌감치 들어와 밤을 밝혔다. 다른 광산에서는 쇠 절구로 돌을 빻아 물로 금을 선별하던 시절이었다. 대동아전쟁을 치르던 일본은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금이 필요했다. 산에는 굴이 부지기수로 뚫리고 그때마다 사람이 늘어났다.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끼니를 거르지 않는다는 것이 전국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5일장이니 3일장이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열리는 상설시장이었다. 그럴수록 금 생산량은 늘었고 그 금을 나르기 위해 일제는 1925년 춘양으로 나가는 도래기재에 금정터널을 뚫었다. 삼동산을 끼고 도는 40여리 산길이 열린 것도 이때였다.
남편이 광산에 들어가면 부인네들은 산뽕나무를 거둬 누에를 쳤다. 캐낸 금이 대동아전쟁의 군자금으로 들어가고 밤을 낮삼아 거둔 명주실이 일본군의 군복이 되는 것을 그들을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식 배를 곯지 않게 하는 것만 다행이었다.
땅을 파기만 하면 쏟아지던 금정의 금은 해방이 닥치기 직전부터 마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광산 일은 줄지 않았다. 전쟁을 치르던 일본은 아연과 중석이 필요했다. 금정계곡 맞은편 구점골에는 삼국시대부터 고아산이 있던 곳이었다. “구점골 앞에 쉰패랭이라고 있어요. 옛날에는 연장이 시원찮으니까 굴을 뚫으려면 불을 잔뜩 놨대요. 돌이 물러지거든. 그러다가 그만 굴이 무너졌는데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는 거라. 그때 국상을 당했다나. 그래서 모두 패랭이를 쓰고 다니다가 광산에 들어갈 때는 벗어놨나봐. 나중에 패랭이를 세어 보니까 50개더래. 50명이 죽은 거지.” 계곡을 건너야 하는 구점골에는 삭도가 놓여졌다. 하늘을 나는 것만 같은 차는 신기했다. 사람들은 삭도에 ‘솔개차’라고 이름을 붙였다.
구점골에서 아연을 캐면서도 일제는 광부 300여명을 추려 대전으로 보냈다. “대전에 대사정이라는 산이었는데 산에 온통 구멍을 뚫어서 산지 사방으로 맞창이 났지. 일본이 군수품을 숨기려고 그랬다나봐.” 그리고 다시 금정으로 돌아와 해방을 맞았다.
금광은 무주공산이 되었다. 금은 캐내는 사람이 임자였다. 일본인들은 위험하다고 피한 구멍에도 사람이 들이닥쳤다. 굴과 갱목 사이를 채우던 폐석까지도 다시 끄집어내졌다. 가끔씩 누군가 노다지를 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은 듣기 어려웠다. 욕심 때문이었다. “개인별로 한다고 했지만 금캐는 일이 어디 혼자할 수 있나. 조를 짜는데 오야를 덕대라고 하지. 덕대가 장비하고 식구들 먹을거리를 대고 캐낸 금은 덕대가 3할 종업원이 7할을 갖고 나눠요. 근데 돈을 벌면 더 크게 벌려고 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지.”
한국전쟁이 끝나고 금정광업소 뒤를 이었던 대명광업소나 함태광업소는 그저 일본인이 남기고 간 찌꺼기 금밖에 만지지 못했다고 한다. 그나마 그것이 가능했던 것도 제련기술이 발전한 덕이었다. 심지어는 금을 선별하느라 가루를 낸 돌가루까지 한번 더 금을 골라내 겨우 수지를 맞춰 나갔다고 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금정의 금 우물에 대한 소문은 끊이지 않는다.
이 할아버지와 같이 소학교를 다녔다는 김수진(71) 할아버지는 몇 년 전 윤아무개씨가 구점골에 찾아들어 굴을 뚫던 곳으로 기자를 데려갔다. 발전기와 광차들이 휑하니 버려져 있었다. 내려앉기 시작한 굴 속에는 배터리카가 바퀴를 물에 담근 채 썩어가고 있었다. 그 안에는 황산이 가득한 배터리가 들어 있을 것이다. 썩어 터진다면 계곡이 어찌될지는 자명한 일이다. 5년 전 광산을 살린다고 굴을 뚫었는데 광맥도 찾지 못하고 중단한 흔적이라고 한다.
김 할아버지와 함께 금정계곡 옛 광산을 찾아 오른다. 한국인 학생들이 다녔다는 소학교 자리는 이미 거대한 낙엽송 숲이었다. 일본인 학생들과 한국인 간부의 자식들이 다녔다는 금정소학교는 다시 지어져 금정분교로 문을 열었으나 이내 폐교된 채 닭들의 놀이터로 변해 있다. 금정계곡에 유난히 많은 낙엽송들은 옛 집터라고 한다. “저 골짝 이 골짝 빈틈이 없었더래요. 낙엽송 자리는 다 집터야.” 김 할아버지의 손끝에서 봉화군 최초의 변전소가 살아나고, 순사가 10명이 넘었다는 주재소가 살아난다. 땔감을 구하려고 산을 오르는 이들을 붙잡아 물꼬를 내던 산림간수 사무실은 50년도 더 됐다는 세월이 무색하게 여전히 멀쩡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고대 성처럼 버티고 섰던 제련장 자리도 하루가 다르게 초록이 지고 있었다. 이미 옛길을 점령한 물길은 제련장 석축을 쉴새없이 두들기며 초록에 힘을 보태고 있었다. 활동사진을 처음으로 보게 해줬던 극장자리며, 미나미 지로 일본 총독이 묵었다는 호텔자리도 이제는 낙엽송에 자리를 내줬다.
김 할아버지는 소학교 시절 금정을 찾았던 일본 총독의 오만한 행동을 잊지 못한다. “환영나오라고 해놓고는 총독이 지나갈 때는 모두 뒤로 돌라는 거야. 그 놈들 참 고약해.” 김 할아버지나 이 할아버지는 자신들의 뼛골을 바쳐 청춘을 살아냈다. 두 할아버지는 모두 제대로 자라난 자식들이 가장 자랑이다. “뭐 자식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살아 공공근로도 하고….” 이 할아버지는 명절이면 찾아오는 자식들에게 줄 고추며 감자를 기르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었다. 몇 년 전부터 금정계곡에는 물고기도 다시 찾아들었다. 손주들이 그 고기를 잡으며 뛰노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입가에는 미소가 가시지 않는다.
금 우물에 금이 마르면서 태백산의 마지막 자락 구룡산에는 푸르름이 가득하다. 최근 들어 하나 둘 금맥을 찾는 발길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고 한다. 금이야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초록이 없이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다. 아직은 기운이 남아 있으니 푸른 공기를 마시며 손주들에게 시골의 추억을 안겨주고 싶다는 노인의 소원이 노다지보다 더 귀하지 않은가.
출처: http://100mt.tistory.com/entry/백두대간사람들-24-도래기재-금정에-금-마르니-초록은-깊어라[<한겨레21> 신 백두대간 기행 블로그]
태백산과 소백산을 가르고 강원도와 경상도를 잇는 고개가 도래기재다. 춘양에서 고개를 넘으면 만나는 첫 동네에는 ‘우구치리’라는 돌 이정표가 세워져 있다. 도래기재에서 바라보는 골짜기 생김새가 마치 소의 입을 닮은 데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도 ‘금정’이라는 이름을 더 친숙하게 부른다. 일본인들이 금광을 개발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당시 금광에서는 물이 많아 나와 금을 캐는 것이 마치 우물 속에서 금을 기르는 것과 같다고 해서 금정(金井)이라 불렀다 한다. 이제는 같은 면인 춘양면에서도 금광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이가 많을 정도로 잊혀져 가고 있지만 금정은 한창 때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가는 금 산지였다고 한다.
“원산인가 함흥인가의 금광이 1등이었고 금정이 2등이었더래요. 한 달에 200kg이 넘으면 보너스도 주고 그랬지.” 이종식(71) 할아버지는 금정의 내력을 간직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노인 가운데 한명이다. 이 할아버지는 지금도 봉화일대에서 술안주로 오르는 금 이야기를 일축한다. “금은 무슨…. 이미 해방무렵부터 금이 줄기 시작했는데 뭘. 한국전쟁이 끝나고 대명광업소가 금을 또 캐고, 나중에 들어온 함태광업소는 몇 군데 시추까지 했지만 금맥을 못 찾았어. 이제 금 없어.” 88올림픽 무렵 함태광업소도 끝내 문을 닫았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온갖 소문이 무성하다. “일본인이 캐간 것은 금송아지의 다리 부분일 뿐이고 아직도 몸통은 남았다.” “광을 아래서부터 뚫어야 물이 안 차는데 꼭대기부터 뚫어서 물이 차올라 채광을 못한다.” “금맥은 있는데 광부들이 도둑질을 해가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 이 할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죄다 영문도 모르는 헛소리라고 일축한다.
금정에 금광의 역사를 시작한 것은 강원도 정선사람 김태연씨라고 이 할아버지는 회고한다. “그 사람이 저 상동읍 덕구에서 처음 광산을 열었어요. 길도 없는 첩첩산중에 어떻게 찾아왔는지 몰라. 와서는 마루 너머 천평 무랭이골에도 구뎅이를 파고 여기도 팠지. 그러다가 일본인들에게 광업권을 넘겼어요. 그때 엄청난 돈을 받아서 50대 재벌에 들었대지.” 이 할아버지 기억이 세월을 역류한다.
금정에 본격적으로 금광을 개발한 것은 일본인들이었다. 산 너머 무랭이골에서 캐낸 광석을 제련장이 있는 금정까지 나르기 위해 그들은 산 허리에 터널을 뚫었다. 엄청난 금의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당시로서는 드문 자동화 설비가 갖추어졌다. 자동화 설비를 돌리기 위한 전기도 일찌감치 들어와 밤을 밝혔다. 다른 광산에서는 쇠 절구로 돌을 빻아 물로 금을 선별하던 시절이었다. 대동아전쟁을 치르던 일본은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금이 필요했다. 산에는 굴이 부지기수로 뚫리고 그때마다 사람이 늘어났다.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끼니를 거르지 않는다는 것이 전국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5일장이니 3일장이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열리는 상설시장이었다. 그럴수록 금 생산량은 늘었고 그 금을 나르기 위해 일제는 1925년 춘양으로 나가는 도래기재에 금정터널을 뚫었다. 삼동산을 끼고 도는 40여리 산길이 열린 것도 이때였다.
남편이 광산에 들어가면 부인네들은 산뽕나무를 거둬 누에를 쳤다. 캐낸 금이 대동아전쟁의 군자금으로 들어가고 밤을 낮삼아 거둔 명주실이 일본군의 군복이 되는 것을 그들을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식 배를 곯지 않게 하는 것만 다행이었다.
땅을 파기만 하면 쏟아지던 금정의 금은 해방이 닥치기 직전부터 마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광산 일은 줄지 않았다. 전쟁을 치르던 일본은 아연과 중석이 필요했다. 금정계곡 맞은편 구점골에는 삼국시대부터 고아산이 있던 곳이었다. “구점골 앞에 쉰패랭이라고 있어요. 옛날에는 연장이 시원찮으니까 굴을 뚫으려면 불을 잔뜩 놨대요. 돌이 물러지거든. 그러다가 그만 굴이 무너졌는데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는 거라. 그때 국상을 당했다나. 그래서 모두 패랭이를 쓰고 다니다가 광산에 들어갈 때는 벗어놨나봐. 나중에 패랭이를 세어 보니까 50개더래. 50명이 죽은 거지.” 계곡을 건너야 하는 구점골에는 삭도가 놓여졌다. 하늘을 나는 것만 같은 차는 신기했다. 사람들은 삭도에 ‘솔개차’라고 이름을 붙였다.
구점골에서 아연을 캐면서도 일제는 광부 300여명을 추려 대전으로 보냈다. “대전에 대사정이라는 산이었는데 산에 온통 구멍을 뚫어서 산지 사방으로 맞창이 났지. 일본이 군수품을 숨기려고 그랬다나봐.” 그리고 다시 금정으로 돌아와 해방을 맞았다.
금광은 무주공산이 되었다. 금은 캐내는 사람이 임자였다. 일본인들은 위험하다고 피한 구멍에도 사람이 들이닥쳤다. 굴과 갱목 사이를 채우던 폐석까지도 다시 끄집어내졌다. 가끔씩 누군가 노다지를 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은 듣기 어려웠다. 욕심 때문이었다. “개인별로 한다고 했지만 금캐는 일이 어디 혼자할 수 있나. 조를 짜는데 오야를 덕대라고 하지. 덕대가 장비하고 식구들 먹을거리를 대고 캐낸 금은 덕대가 3할 종업원이 7할을 갖고 나눠요. 근데 돈을 벌면 더 크게 벌려고 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지.”
한국전쟁이 끝나고 금정광업소 뒤를 이었던 대명광업소나 함태광업소는 그저 일본인이 남기고 간 찌꺼기 금밖에 만지지 못했다고 한다. 그나마 그것이 가능했던 것도 제련기술이 발전한 덕이었다. 심지어는 금을 선별하느라 가루를 낸 돌가루까지 한번 더 금을 골라내 겨우 수지를 맞춰 나갔다고 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금정의 금 우물에 대한 소문은 끊이지 않는다.
이 할아버지와 같이 소학교를 다녔다는 김수진(71) 할아버지는 몇 년 전 윤아무개씨가 구점골에 찾아들어 굴을 뚫던 곳으로 기자를 데려갔다. 발전기와 광차들이 휑하니 버려져 있었다. 내려앉기 시작한 굴 속에는 배터리카가 바퀴를 물에 담근 채 썩어가고 있었다. 그 안에는 황산이 가득한 배터리가 들어 있을 것이다. 썩어 터진다면 계곡이 어찌될지는 자명한 일이다. 5년 전 광산을 살린다고 굴을 뚫었는데 광맥도 찾지 못하고 중단한 흔적이라고 한다.
김 할아버지와 함께 금정계곡 옛 광산을 찾아 오른다. 한국인 학생들이 다녔다는 소학교 자리는 이미 거대한 낙엽송 숲이었다. 일본인 학생들과 한국인 간부의 자식들이 다녔다는 금정소학교는 다시 지어져 금정분교로 문을 열었으나 이내 폐교된 채 닭들의 놀이터로 변해 있다. 금정계곡에 유난히 많은 낙엽송들은 옛 집터라고 한다. “저 골짝 이 골짝 빈틈이 없었더래요. 낙엽송 자리는 다 집터야.” 김 할아버지의 손끝에서 봉화군 최초의 변전소가 살아나고, 순사가 10명이 넘었다는 주재소가 살아난다. 땔감을 구하려고 산을 오르는 이들을 붙잡아 물꼬를 내던 산림간수 사무실은 50년도 더 됐다는 세월이 무색하게 여전히 멀쩡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고대 성처럼 버티고 섰던 제련장 자리도 하루가 다르게 초록이 지고 있었다. 이미 옛길을 점령한 물길은 제련장 석축을 쉴새없이 두들기며 초록에 힘을 보태고 있었다. 활동사진을 처음으로 보게 해줬던 극장자리며, 미나미 지로 일본 총독이 묵었다는 호텔자리도 이제는 낙엽송에 자리를 내줬다.
김 할아버지는 소학교 시절 금정을 찾았던 일본 총독의 오만한 행동을 잊지 못한다. “환영나오라고 해놓고는 총독이 지나갈 때는 모두 뒤로 돌라는 거야. 그 놈들 참 고약해.” 김 할아버지나 이 할아버지는 자신들의 뼛골을 바쳐 청춘을 살아냈다. 두 할아버지는 모두 제대로 자라난 자식들이 가장 자랑이다. “뭐 자식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살아 공공근로도 하고….” 이 할아버지는 명절이면 찾아오는 자식들에게 줄 고추며 감자를 기르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었다. 몇 년 전부터 금정계곡에는 물고기도 다시 찾아들었다. 손주들이 그 고기를 잡으며 뛰노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입가에는 미소가 가시지 않는다.
금 우물에 금이 마르면서 태백산의 마지막 자락 구룡산에는 푸르름이 가득하다. 최근 들어 하나 둘 금맥을 찾는 발길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고 한다. 금이야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초록이 없이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다. 아직은 기운이 남아 있으니 푸른 공기를 마시며 손주들에게 시골의 추억을 안겨주고 싶다는 노인의 소원이 노다지보다 더 귀하지 않은가.
출처: http://100mt.tistory.com/entry/백두대간사람들-24-도래기재-금정에-금-마르니-초록은-깊어라[<한겨레21> 신 백두대간 기행 블로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